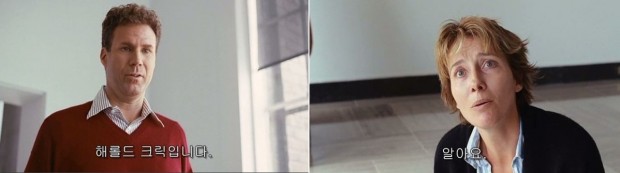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급 여름.ㅋㅋㅋ
며칠 전 봄 기운이 솔솔 돋아나서 여기저기 놀러가고 싶은 날에
은행나무에서는 봄맞이 창고정리가 있었어요!
봄이 올랑말랑한 날씨였지만 노동을 했더니 땀이 뻘뻘나고 집에 가서는 기절했답니다. ㅋㅋㅋ
***
출간된 책들은 물류센터에 많이 보관을 하고요.
출판사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책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관해오던 책 중에서 보통 계약이 만료된 책이나
더 이상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책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정리, 즉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한다고 해서 그냥 갖다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폐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강렬한 색깔의 스프레이 락커를 뿌립니다.
출판사에서는 폐기한 건데 다른 데서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면 안 되니까, 일종의 유비무환으로 말이죠.
폐기하는 책들의 부수도 파악해서 팔다리의 온갖 근육을 이용하여 용달차에 책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에는 파스가 필수용품
저는 힘세다고 힘만 믿고 잔뜩 옮기다가 그 다음 날 목부터 팔꿈치까지………………..
사실 이렇게 폐기되는 책들을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데요.
***
언젠가 <스트레인저 댄 픽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국세청 직원으로 12년을 살아오면서 머릿속에는 ‘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찬 ‘헤럴드’라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헤럴드는 어느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한 여자의 목소리(우리에게는 나레이션으로 들리는 목소리)를 쫓아요.
그 목소리는 헤럴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헤럴드가 곧 죽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헤럴드는 그 여자가 항상 ‘아름다운 비극’을 쓰는 소설가 ‘아이렌’이라는 걸 알고는 그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주인공과 소설가의 만남이라니,
주인공 헤럴드는 자신이 실재한다며 제발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렌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수없이 죽여온 주인공까지 생각이 나서,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곱씹고 곱씹었죠.
***
이 영화에서 혹은 현실에서의 소설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설 속의 한낱 허구의 인물일지라도 그 주인공의 죽음에 대해서, 소설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 쓰여진 시점부터 독자가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주인공은 몇 백번이고 몇 천번이고 계속 죽는다는 거죠.
이 영화의 엔딩이 다가올수록 소설가가 주인공에게 갖는 애정을, 그녀의 말과 그녀의 눈빛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헤럴드, 주인공이 실제 살아있는 인물로 ‘걸어다닌다’는 설정이
우리에게도 오롯이 그 감정이 느껴지게 했죠.
폐기되는 책들을 보면서 편집자의 책임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편집자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질적 가치가 아니라 양적 무게로 평가되는 아이로 변질되었고
거기에는 편집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렌이 결국 헤럴드를 살리는 결론을 택한 것처럼
편집자도 어떻게 살아있는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항상 고군분투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폐기되는 일 없이 은행나무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릴 수 있도록
다시 으쌰으쌰 힘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ㅋㅋㅋㅋ
여러분은 굿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