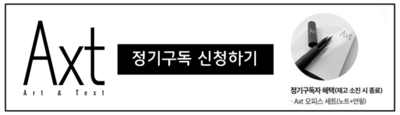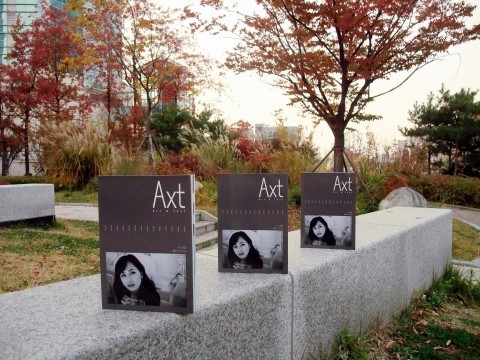
악스트 3호가 나왔다.
이번 호가 나오기도 전 어느 평론가께서 악스트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트윗했다며 한 편집부원이 내게 조심스레 말해주었다. 그분의 말도 말이지만 나는 요즘 정말 다시 산에 가고 싶다. 딱히 산을 오르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걷고 싶달까. 불합리와 소음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정치 현실을 대면할 때마다 문득, 나는 네팔을 떠올린다. 거기에서 느꼈던 장대한 시간이 주는 힘, 인간이 디자인한 모든 것을 갈음하는 자연의 신성 같은 걸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불편한 시국으로 인해 마음이 피로해서일까. 불합리를 무심코 견디는 데에 좀 지쳤다.
네팔에 있던 4개월 동안, 유난히 많이 걸어 다녔다. 평생에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서울에서 파주쯤 되는 거리를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걸어 당도하곤 했으니 한국에서와는 달리 그곳에서의 거리 개념이 바뀐 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돈을 아끼려는 마음도 분명 있었고 좀 보헤미안적인 풋내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왠지 걸어야만 맘이 편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발목, 무릎 등에서 통증이 와야지만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프면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걷기만 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의 이유는 이미 잊었는데, 걷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지금 머리로 알고 있다. 격렬한 반동은 관성을 누그러뜨린다. 아마도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 같은 걸 자유로움처럼 느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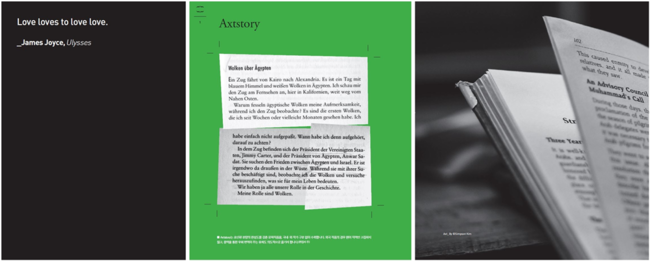
『Axt』 3호 중 일부 (*Axtstory는 초단편 분량의 완성도를 갖춘 문학작품을, 국내·외 작가 구분 없이 수록합니다.)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던 건 다시 무작정 걸어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행하려 하는 일들의 무모함 등을 목도하면서 자꾸만 행선지 없이 걷고만 싶은 것이다. 이 비현실의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을까. 그 욕망의 해결을 경험해봤던 네팔을 그래서 그렇게 떠올리고 했나 싶은 것이다. 그런 와중에 악스트 3호를 마감했다. 나뿐만 아니라 참여한 필자들 곳곳의 활자에서 작금의 비현실에서 벗어나고픈 갈망이 슬며시 비치기도 하였다. 공 선생의 인터뷰에서의 언급처럼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격렬하게 진실을 향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다만, 우리들을 덜 다치게 하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절히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언제나 똑같은 원칙이 보였다. 그것은 그나마 진실이 모두를 덜 다치게 한다는 것. 진실이 우리를 해칠 것 같고, 바르게 얘기하면 고통을 받을 테니 숨겨야 할 것 같지만, 아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가장 덜 다치게 할 수 있다.”
- 악스트 3호 <cover story> 공지영, 본문 중에서

(*악스트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나는 답할 것이다. 덧붙여 그나마 내가 아는 건 택시나 버스보다 걷는 걸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다.)